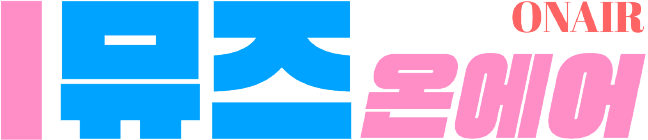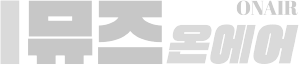![사진 : 영화 '얼굴' 포스터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http://www.museonair.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142993108_6f10fe.jpg?iqs=0.05833450104439164)
대한민국 영화계에 다시 한 번 독특한 물음을 던진 연상호 감독이 신작 <얼굴>로 돌아왔다. 박정민, 권해효, 신현빈 주연의 이 영화는 ‘얼굴’이라는 단어의 물리적 정의와 사회적 편견을 동시에 뒤흔드는 작품이다. 개봉 직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흥행 가능성까지 입증한 <얼굴>은, 관객들에게 추리극 이상의 감각적 체험을 제안한다.
영화는 전각 장인 임영규(권해효)의 다큐멘터리 촬영 장면으로 시작된다. 시각장애를 가진 그는 세계적 예술가로 존경받으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평온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아들 임동환(박정민)에게 40년 전 실종된 어머니 정영희(신현빈)의 백골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더욱 의문을 남기는 것은, 그녀가 살아생전의 흔적이 사진 한 장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 사진 : 영화 '얼굴' 포스터 및 스틸컷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http://www.museonair.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142990332_0bda8f.jpg?iqs=0.09964477556905826)
임동환은 어머니의 과거를 추적하며 그녀가 생전에 겪었던 시선과 차별, 그리고 죽음의 단서를 따라간다. 다큐 PD 김수진(한지현)과 함께 진행하는 인터뷰는 점점 더 정영희의 존재를 실감하게 하지만, 그 ‘얼굴’만큼은 끝까지 드러나지 않는다. 영화는 이 부재를 통해 관객의 상상 속에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
영화 <얼굴>속 정영희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지만 관객은 그녀를 둘러싼 증언과 묘사를 통해 점차 그녀의 존재를 체감한다. 문제는 그 묘사들이다. “못생겼다”, “보기 불편했다”는 증언이 반복되며 ‘추함’에 대한 사회의 편협한 시선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 사진 : 영화 '얼굴' 포스터 및 스틸컷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http://www.museonair.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142975757_70bc57.jpg?iqs=0.16918081922307937)
연상호 감독은 정영희의 얼굴을 끝까지 숨기며, 오히려 관객 스스로가 ‘그녀는 어떤 얼굴이었을까’를 상상하게 만든다. 그 상상은 관객 개개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이 영화가 마치 한 편의 심리적 실험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배우들의 연기도 작품의 몰입도를 극대화한다. 박정민은 시공간을 넘나들며 아버지 임영규의 젊은 시절과 아들 임동환을 동시에 연기한다. 자칫하면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설정을, 박정민은 결의에 찬 눈빛과 무게감 있는 내레이션으로 설득력 있게 이끌어낸다.
신현빈은 영화 내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인물을 연기하는 어려운 도전에 과감히 뛰어들었다. 정영희라는 인물은 오직 목소리와 실루엣, 움직임만으로 표현되는데 신현빈은 그 제한된 수단 안에서 인물의 감정 곡선을 정교하게 드러낸다. 한 마디로 ‘얼굴이 없는데도 가장 인상적인 연기’라 할 만하다.

![ 사진 : 영화 '얼굴' 포스터 및 스틸컷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http://www.museonair.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142962576_750bae.jpg?iqs=0.7897385169506753)
<얼굴>은 연상호 감독이 2013년 대본 작업을 마친 동명 웹툰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오랜 시간 구상한 만큼, 영화는 대사 하나, 프레임 하나까지 계산된 연출이 돋보인다. 약 2억 원의 초저예산, 13회차 촬영이라는 조건에서도 1970년대 청계천 공장과 골목, 다큐 인터뷰 공간 등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몰입감을 유지한다.
특히 감독이 선택한 ‘정영희의 얼굴을 끝까지 숨기는 방식’은 매우 실험적이지만, 영화의 주제와 완벽하게 부합한다. 외모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존재 자체가 삭제된 여성의 목소리, 그리고 남겨진 이들이 겪는 침묵의 유산까지, <얼굴>은 이 모든 문제를 묵직하게 질문한다.
그리고 결말에서 ‘정영희’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영화는 장르를 뛰어넘어 철학적 사유의 장으로 확장된다. 관객은 그 얼굴을 마주하는 동시에 영화 내내 마음속에서 조합했던 상상의 이미지와 충돌하게 된다.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미스터리를 중심으로 인간의 본질과 사회적 낙인, 기억의 퍼즐을 조심스레 맞춘 <얼굴>은 호불호가 분명한 작품이다. 정영희의 얼굴, 그리고 그를 향한 수많은 평가들, 그리고 내면의 응시까지. 영화는 마치 질문처럼 머물며 오랜 여운을 남긴다.
사진 : 영화 '얼굴' 포스터 및 스틸컷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